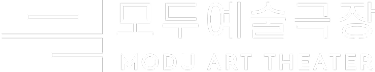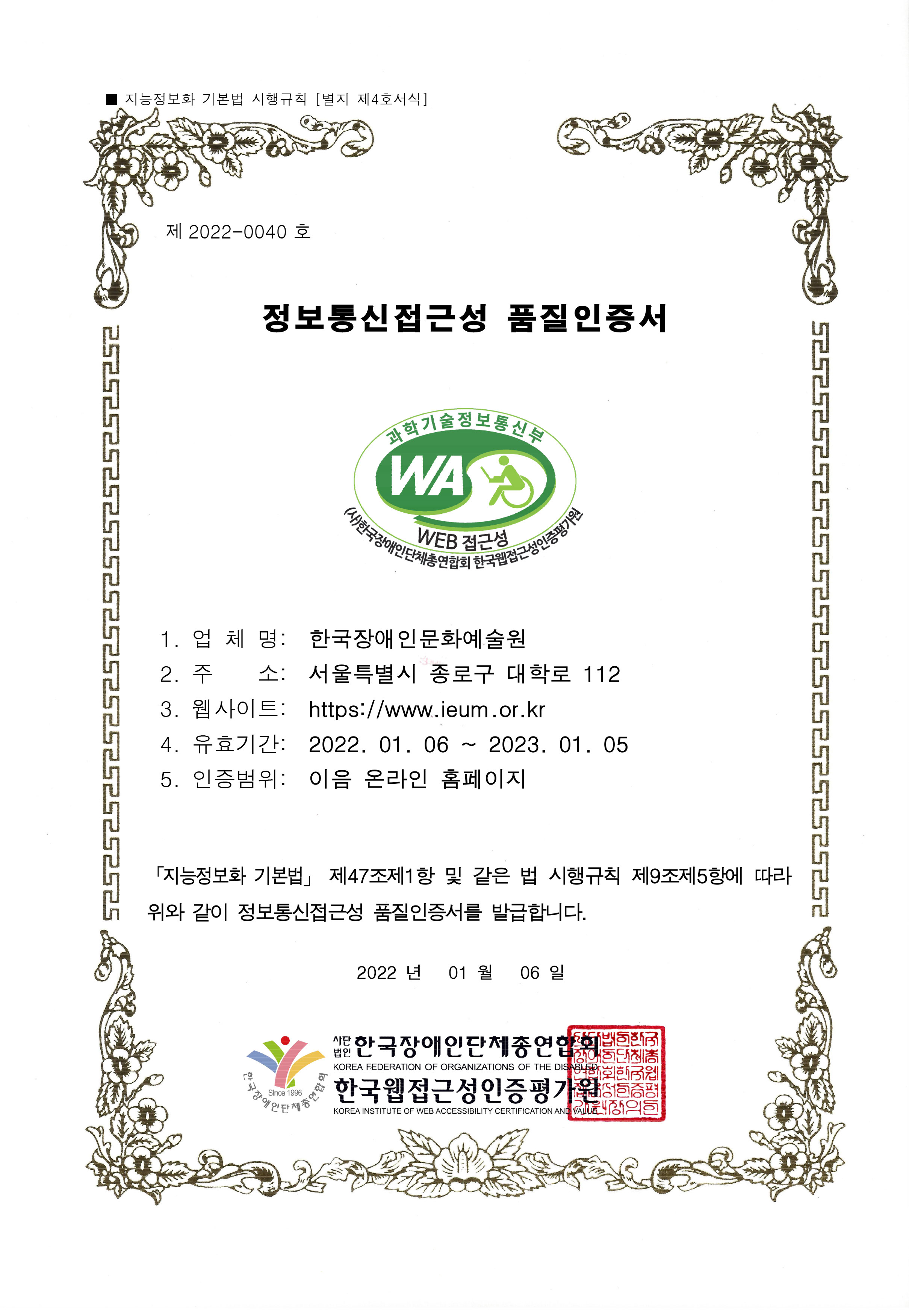019년 0set프로젝트 <관람모드 - 보는방식> 전시-공연 중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바닥에 부착된 문구,
사진 출처 : 이영건 @ 0set프로젝트
“배리어컨셔스(barrier-conscious), 문턱을 없애는 것을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부르지만
눈에 보이는 배리어를 없앤 곳에도 여전히 배리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없다고 말하기 보다 오히려 ‘배리어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 - 법인 탄포포노이에[민들레의 집] 편저, 오하나 역 <소셜아트 – 장애가 있는 이와 예술로서 사회를 바꾸다> 미쓰시마 다카유키 인터뷰 중
2019년에 사로잡힌 질문은 ‘있지만 없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보이지만/인식되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 있음에도 왜 볼 수/인식할 수 없을까. 2019년에 진행한 <관람 모드> 프로젝트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왜 이런 질문들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0set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의 흐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글은 2017년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또한 추가되고 변형되고 있는 0set프로젝트의 시도들에 관한 정리이다.
어떤 사실이 문제로 인식된 순간부터 접근성에 관한 질문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거리와 건물에 셀 수 없이 많은 ‘턱’이 있다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사실들이 새삼스럽게 인식되면서부터 기존에는 공연을 보거나 제작하는 공간일 뿐이었던 극장도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관한 의심, 그것이 시작이었다.
대학로 거리에는 표만 끊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듯이 공연 홍보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다. 하지만 ‘도움 없이’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은 소수에 불과하며, 배리어프리 공연이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극장은 없다.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 누군가는 어떤 공연을 보러 갈까라는 고민 이전에 극장 건물 입구, 공연장 입구,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는지, 너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누군가는 문자통역,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공연에 한해서만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소수의 접근성은 쉽게 누락되거나 애초에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문제 제기 역시 소음이 되어버리거나 ‘맞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 금방 잊힌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너’와 함께 극장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식한 순간,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질문들로 확장된다. 극장이 누군가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누군가는 무엇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인가. 배제당한 사람들이 그곳을 ‘침범’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모두 그 행위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공감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 극장에 있는 것들
우선 극장이 얼마나 닫혀있는지를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6년 <장애극장>, 2017년 <불편한 입장들>, 2018년 <나는 인간> 공연 제작 과정 안에 관객들이 직접 줄자와 체크리스트를 들고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턱의 높이를 재보고 공간의 너비와 깊이를 확인하는 워크숍을 포함시켰다. ‘함께’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시설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손수 파악하는 시설 접근성 모니터링에 관객을 참여시킨 것이다. 관객들은 워크숍을 통해 ‘턱’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장애인의 몸에 있다고 여겨진 장애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턱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2. 공연에 없는 것들
워크숍을 마친 후 객석에 자리한 관객들이 다음으로 마주하길 바랐던 것은 공연의 접근성이었다. 한편으로는 예술가 또는 창작자로 쉽게 셈해지지 않는 장애인 창작자들의 신체와 이야기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았던 요소들이 공연의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원했다. 2017년 <연극의 3요소>는 일반적으로 연극의 3요소로 언급되는 극장, 배우, 관객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을 공연에 넣고자 한 시도였다.
휠체어 이용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배우’라는 역할 자체, 그리고 서로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 움직임 장면 등으로 구성해 공연에 담았다. 공연은 서로의 이야기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접근해가는 공감과 연대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는 관객들 역시 두 배우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아가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공연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귀에 들리는 모든 대사를 문자통역(스크린 영사) 했고(청각장애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통과 나눔을 추구하는 AUD사회적협동조합(http://audsc.org)에 문자통역을 신청해서 공연의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 묘사를 대사화해서 대사의 일부가 곧 화면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했다.
3. 우리 사이에 없는 것들
공연을 마친 후 몇몇 관객들은 내게 와서 몰랐던 장애인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며 반드시 시설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주었다. 또 다른 몇몇 관객들은 너무 ‘옳은’ 이야기이고 복지와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공연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공연의 부족함과는 별개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같은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은 어떤 이미지로, 어떤 경험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일까. 너무 ‘옳은’ 이야기라고 하기엔 우리는 여전히 ‘틀린’ 현실에 살고 있다. 또한 복지와 정치의 영역을 예술적-감각적 경험과 분리해 사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무리 지어 있는 추상적인 장애인, 보호와 개선이 필요한 연민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혹시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인간>은 그 질문에 관한 탐구 과정이었다. 당연한 듯 모든 인간에게 전제되는 나는 인간(I am human)이라는 말과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나는 인간(Flying human)이라는 존재 사이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누군가는 당연한 듯 전제되는 인간, 즉 나(I)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여겨지는 극장에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듯이.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나는 인간(I am human)이 나는 인간(flying human)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고자 할 때, ‘나는 인간’이다라고 외칠 때, 실패하거나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시도와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이 밟고 서 있던 기반을 뒤흔드는 행동과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른 생각, 경험 가지고 있는 타인을 궁극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역시 나는(flying) 행위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 쉽사리 이해해버리고 마는 것을 멈추고 몇 번이고 보고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럴 때 비로소 표현하고자 하는 몸짓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2019년 <관람모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사이에 있지만 없는 것들 특히 극장, 공연,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과 태도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후의 글들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고민들과 2020년에 이어질 시도들에 관한 자기 기록 혹은 자기 질문이 될 것이다.
신재
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할 말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 창작 작업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프로젝트 형식으로 조사, 워크숍, 공연 제작 등을 하는 ‘0set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footlooseyou@gmail.co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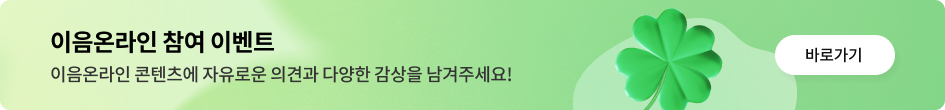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