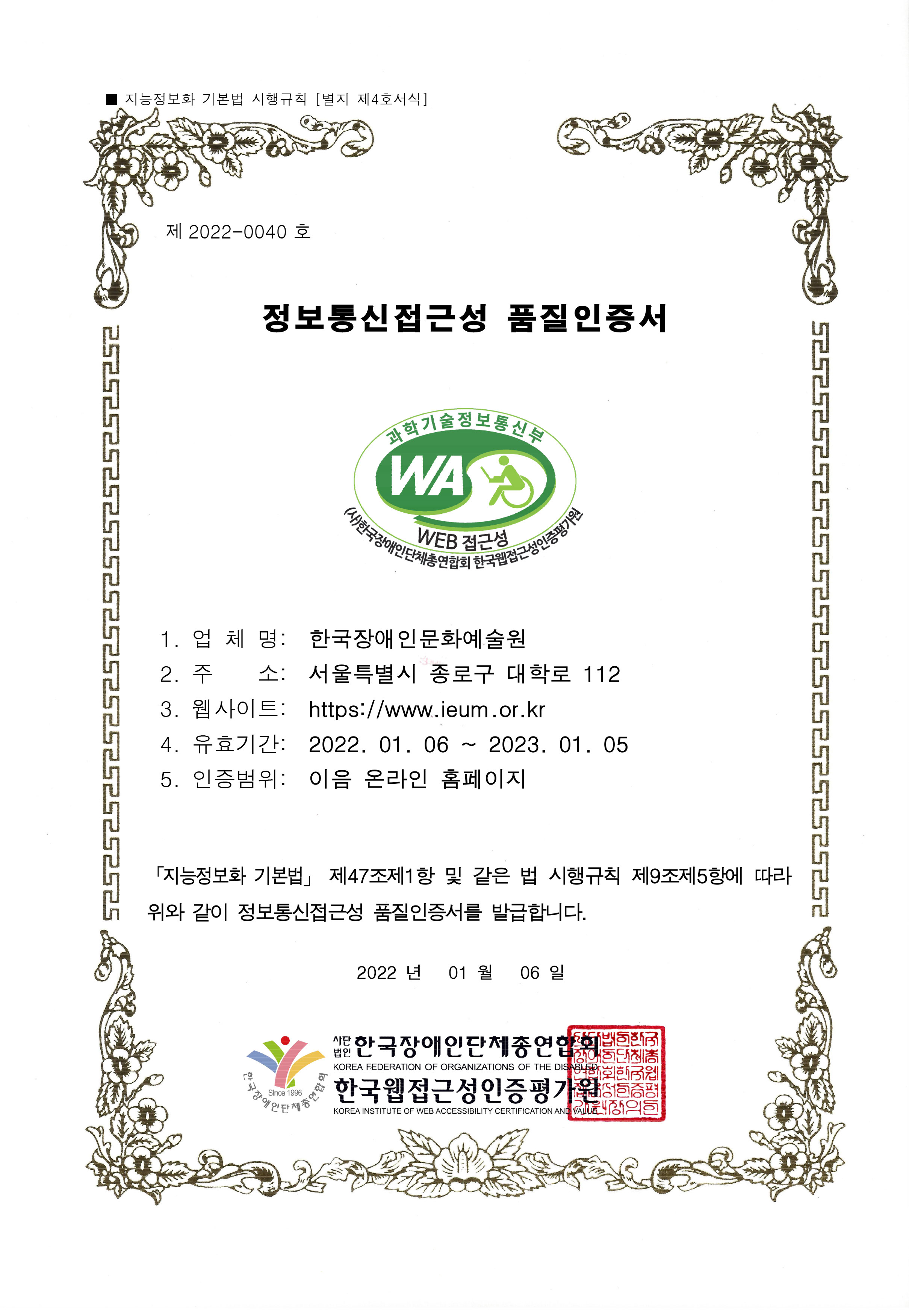인터뷰
전경호 퍼커셔니스트
빛으로 울림으로 온몸으로, 소리와 부딪치다
봄이 성큼 느껴지던 5월의 오전,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마림비스트인 전경호 작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달라는 제안이었다. 마침 전경호 작가가 몇 년 동안 참여한 아트엘의 <듣다> 프로젝트에 나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합류하게 되어 며칠 전 인사를 나눴던 차였다. 인연이 묘하다 싶은 이 만남의 기회에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동시에 처음 맡는 역할에 다소 긴장이 밀려오기도 했다. 걱정과 설렘으로 맞이한 인터뷰는 오늘의 안부 인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 네 시쯤 일어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악보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어디선가 환하게 빛이 비쳐오는데, 이게 달빛의 느낌인지 어디선가 불을 밝힌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런 빛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은 제가 늘 해왔던 연주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은 소리를 듣기만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면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소리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작업을 하며 일부러라도 온몸으로 소리와 부딪치며 지내고 있어요.”
전경호 작가는 오케스트라가 좋아서 마림바 연주를 시작했다. 그에게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샌드위치나 비빔밥처럼 다양한 맛을 내는 악기들이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어우러져 뿜어내는 하모니의 울림에 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성격의 연주자와 악기가 작곡가의 악보를 매개로 이야기를 느끼며 연주하는 하나의 공동체 혹은 사회와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사회를 만나는 과정에서 전경호 작가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속도의 경험을 수행하고 시도한다. “4인용 식탁만 한” 커다란 마림바 악기와 오랜 연습 시간을 비롯해 악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시중에 구하기 쉬운 오케스트라 스코어도 점자로 점역하면 약 10~15배 비용이 든다. 이렇게 악보를 새롭게 만들고 외우는 과정에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음악이라는 것은 음을 소재로 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울림까지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리를 만지는 ‘아티스트’로서 모든 소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여겨요. 무의미한 소리는 없죠. 악보는 작곡가의 이야기, 작곡가의 소설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악보가 점자로 변환되는 과정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작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다면 연주자에게 악기란 무엇일까? 그건 마치 신체의 확장과 같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그는 동의를 해주었다. 감당할 수 없이 넓고 컸지만, 맑고 깊은 소리와 영롱한 음색 때문에 악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전경호 작가 자신을 비추는 듯했다. 한때 그는 감당할 수 없이 넓은 마림바를 정복의 대상처럼 느끼며 전투적으로 연주할 때도 있었다. 그 시기를 거쳐 최근에는 전투적인 연출이 필요한 곡을 연주할 때 외에는 마림바의 소리에 담긴 빛을 음미하며 연주하는 듯했다.
“영롱한 빛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며시 내려앉는 빛처럼 소리가 주욱 이어지게 느껴져요. 실제로 몸에서 그렇게 반응하니까 소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마림바라는 악기와의 만남 속에서 전경호 작가가 자신의 신체 감각을 확장해 왔다면, 동시에 그는 오케스트라 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음악에 대한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는 듯했다. 그 시도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듣다> 프로젝트가 있다. 노경애 안무가의 기획으로 2018년 시작된 이 작업은 다양한 장르의 장애/비장애 창작자들이 만나 ‘듣는’ 행위를 주제로 협업하는 예술 프로젝트다.
전경호 작가는 <듣다> 프로젝트에 첫 해부터 참여하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을 만나 협업해왔다. 2020년 <듣다 : 3년간의 연구>에서는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며 손짓, 몸짓, 표정 같은 제스처와 음악의 연결성을 탐구했다. 프로젝트 내에서 청각 장애가 있는 창작자와의 만남은 그가 몸으로 듣는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는 핀란드의 아티스트를 통해 인연이 된 영국의 프로그래머와 함께 2018년부터 장애인 연주자의 지휘 인지를 돕는 ‘버즈비트(Buzz Beat)’ 장치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버즈비트는 지휘를 진동으로 바꾸어 시각 장애인 연주자가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버즈비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오케스트라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지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소리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비트가 항상 소리보다 빠르더라고요. 보통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비트를 보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다음 연주를 준비하게 되는데, 제가 소리로만 듣고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어요.”
어쩌면 오케스트라 음악은 그에게 마림바를 연주하게 이끌어주는 빛이자, 동시에 크고 작은 한계의 경험을 주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예전에는 비주류 악기였던 악기가 현대에 와서는 주류 악기가 되거나, 그전에는 오케스트라 악기가 아니었던 마림바가 어느샌가 오케스트라 실내악에 등장하여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 변화와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전경호 작가도 비슷하게 과거에는 한계라고 느꼈던 것들을 다시 새로운 길로 만든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다.
“제가 순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많은 것에서 한계를 생각하고, 좌절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지점에서 실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쓸데없이 낙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싶지도, 장르를 규정짓고 싶지도 않아요.”
하모니의 울림이 있는 오케스트라를 향해 걷는 전경호 작가의 여정은 어떤 시점에서 보기엔 남들보다 배로 더 걸리는 시간을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화 속에서 그가 이 과정을 통해 본인만의 음악적 세계에 대한 실험과 성찰을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로 혹은 빠른 속도로 확장하며 문을 열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이 있다면 울림을 줄 수 있는 음악, 스토리가 있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음악의 한계나 사회에서 어울림의 한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휘 비트를 인지할 수 없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제한된 시선과 환경보다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열리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그는 결코 쉽게 긍정할 수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살포시 이야기를 해주었다. 때론 체념이 있던 시간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꾸준한 사랑과 움직임으로 자신만의 길을 횡단하고 있는 그의 행보에 묵직하고 단단한 빛을 느낀다. 그렇게 전경호 작가는 단순한 낭만이 아닌, 삶이라는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행복한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이런 환경에서 무언가 이뤄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소리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다들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더 깊어질 그의 음악 세계가 벌써 기대된다. 덧붙여, 그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캐럴에 대한 애정을 담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짧은 시간 동안 따스한 빛이 담긴 음악 이야기를 나눠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나는 최근에 읽은 책의 몇 구절을 그에게 읽어 주었다. 그중 한 구절로 그와의 대화에 대한 글을 마무리해 본다.
“노래는 강과 같아서 한 곡 한 곡이 자신만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하지만 모든 노래는 그렇게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른다.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바다에.” - 존 버거,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p.83

듣다2 (2019)

듣다3 (2020)

전경호
마림비스트, 퍼커셔니스트. 한빛맹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개막식 공연, 2017년 ACCAC(Accessible Arts and Culture) 초청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과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KBS 교향악단, 유라시안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6년 첫 독주회 이후 2017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번째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영국 휴먼인스트루먼트와 함께 지휘인지 보조장치 ‘버즈비트’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오로민경
빛과 소리의 움직임을 경험하며 흐르는 시간의 현상에 집중하며 공간과 놀이를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소리의 풍경을 마주하고 들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의 기억, 흔들리는 잎의 미묘한 떨림 등을 관찰하며 ‘더 작은 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해 보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전시 <영인과 나비: 끝의 입자 연구소에서 온 편지>
baahram@gmail.com
영상. 박유미 미술작가 gomako1983@hanmail.net
사진. 박영균 미술작가 infebruary14@naver.com
프로그램 사진 제공. 듣다프로젝트
2021. 6월 (20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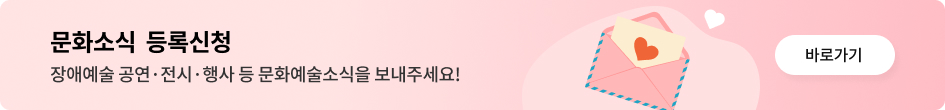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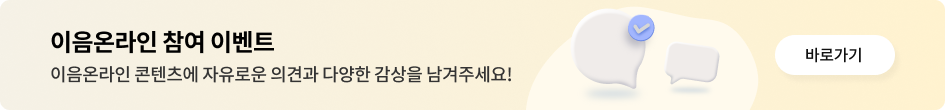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