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시선⑤ 시집 『통증을 켜다』
트렌드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시인
- 글 윤석정 시인·문학공연 연출가
- 등록일 2021-01-27
- 조회수325
트렌드리포트
장애의 시선⑤ 시집 『통증을 켜다』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시인
눈동자는 쪼그라들어 가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짓무른 손가락 끝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눈동자
그즈음 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여유를 배웠다
스치기만 하여도 환해지는
열 개의 눈동자를 떴다
– 손병걸,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부분
어린 시절,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손의 감각으로만 걸었던 적이 있다. 이날은 칠월칠석이었고 나는 해가 저물도록 귀가하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칠령사(내 고향에 있는 작은 절)에 갔다. 여느 때처럼 우리 동네 어머니들은 절에서 불공을 올렸고 타지에서 온 불자(佛子)들에게 밥을 챙겨줬다. 나는 바깥채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며 솥뚜껑을 열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빨리 가자고 떼를 썼다. 술에 취한 듯 불콰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달빛마저 구름에 덮여 눈앞이 깜깜했고 아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는 어머니 손을 꼬옥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길가의 나무들을 더듬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환해지는 감각
손병걸 시인의 시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를 읽는 순간 선명하게 떠오른 옛 기억이었다. 손이 눈이 되어준 유일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른살이 되던 1997년에 희귀난치성질환 베체트씨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때 그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줬던 게 문학이었고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시인이 됐다. 그는 “피를 토하듯 삶에 대한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우울한 노출증 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주어진 삶에 대한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긍정이 있어야 했다”(에이블뉴스, ‘시각장애 손병걸 시인에게 시는 구원’, 2017.10.26)고 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은 그의 시집 『푸른 신호등』(문학마루, 2010),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애지, 2011), 『통증을 켜다』(삶창, 2017)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 시인의 밝은 어둠과 마주하려면 먼저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를 관통해야만 한다. 그는 시적 대상이나 정황을 감각적으로 포착해 사유하고 상상력을 부풀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시에서 평상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과 대면하게 된다. 그의 세 번째 시집 『통증을 켜다』는 어둠 속에서 환해지는 감각들이 가득했다. 그가 열 개의 눈동자를 갖기 전까지 ‘직접 보지 않으면/믿지 않고 살아왔다(「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고 고백했듯 그동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시각)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지 않았나 되돌아봤다.
보이지 않는 것
손병걸 시인의 시편들은 묵직하고 진정성 있는 시 세계를 펼쳤다. 이는 ‘진실 없는 허구에 아름다움이 없듯(「소꼬리」)’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하게 시적 표현을 했기 때문이리라. 그의 사유와 상상력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정서와 생활, 사회적 문제 등에 맞닿아 있다.
눈을 뜨고는 알 수 없는 말
단연코 들을 수 없는 말
(중략)
비어 있어서 명백히
비어 있지 않다는 드넓은 소리
밤하늘에 빛나는 시공의 소리
– 「빈칸」 부분
시집 『통증을 켜다』의 서시 「빈칸」에서 시적 화자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로 낭독을 들으며 ‘활자와 활자 사이’ ‘행과 행 사이의 빈칸’ ‘빈 줄’을 소리로 듣는다. 그래서 시인은 눈을 뜨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여백의 울림(말)을 ‘꽉 찬 공명’ ‘먹먹하게 환한 저 빈칸 혹은, 빈 줄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바람을 덧칠하는 생생한 사물들
소리의 상형문자들 내 귀를 후벼대며
더 크게 더 짙게 속속들이 채색하는
까무룩 완성된 그림 한 점 향기가 명쾌하다
– 「묵화를 그리며」 부분
화자는 몸속에 고인 어둠이 넘쳐 돌벼루 속에 찰랑이고 어둠보다 선명한 것을 사유한다. 이내 화자는 어둠으로 보이지 않는 ‘텅 빈 시간과 공간이 내어준 산골짝 산수화’를 그리면서 ‘바람을 덧칠하는 사물들’ ‘소리의 상형문자들’이 채색한다는 상상을 펼친다. 이러한 시인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까.
빠끔히 열린 방문 사이로
딸아이 그림 그리는 소리 흘러나온다
하얀 도화지를 간질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소리 소리가
소나무 두루미 해바라기 바다가 되어
형형색색 살아나는 그림
(중략)
비 그친 새벽 소실점 찍힌 하늘이 환히 열리고
햇볕 머금은 푸른 강물 일렁이는 도화지에서
휘영청 떠오른 무지갯빛 향기로운 소리가 난다
– 「하얀 도화지의 소리」 부분
하얀 도화지에 딸이 그림 그리는 소리를 들으며 화자는 보이지 않는 소리만으로 형형색색 살아나는 그림을 연상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마음속에 자란 풍경을 떠올리며 손에 쥔 붓의 농도를 고민한다. 화자는 ‘짙은 지하방 어둠을 지우’고 ‘무지갯빛 향기로운 소리’를 듣는다. 단연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소리의 향기가 아닐까 싶다.
이 겨울은 이렇게 살자
그러나 여기는 이주 대책 우선 지역
뽀족한 방법이 없는 기관에서
골머리를 앓는 산동네가 아니던가
– 「산동네 골목 안 오케스트라」 부분
머리맡 창밖 경사진 골목길
발소리 발소리 위로 꽃향기 수 놓으며
송이눈꽃 송이눈꽃 하얗게 쌓이는 겨울
나는 얼른 보일러 온도를 두어 칸 내린다
이 겨울은 이렇게 살자
– 「곶감」 부분
어쩔 수 없는 봄이다
골목 안 부산한 발소리만큼
겨우내 굳게 닫혔던 창문들
빠짐없이 활짝 열리며
일제히 말문이 터지는 봄이다
– 「산 108번지」 부분
「하얀 도화지의 소리」에 지하방이 나오듯 시인은 삶의 공간을 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 시에서 가난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골목에서 오케스트라를 듣고 송이눈꽃의 향기를 맡고 일제히 말문이 터지는 봄을 느낀다. 시인의 두 눈은 닫혔지만 지난날들을 기쁘게 걸어왔고 흰지팡이로 환한 외출을 한다. 그의 긍정적인 삶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비 갠 후」)’하기 때문에 어둠보다 밝음을, 절망보다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다고 시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다룬 「몰락의 바다」, 청소년들의 투신자살을 그린 「목련꽃 뉴스」, 세월호의 슬픔을 함께한 「빈집」과 「순장」 등이 그러하다.
채 피지 못한 꽃봉오리
꽃향기 꽃향기 어지러운
달빛 꺼진 캄캄한 밤
고층아파트 꽃대 위에서
또 한 송이 목련꽃 진다
– 「목련꽃 뉴스」 부분
돌아오지 않는 아이가
바다 속에 갇혀 돌아올 수 없는 아이가
멀쩡히 숨 쉬고 있다
(중략)
죽지 못해 살아 있어 살아야 할
나도 분명 할 일 있다 아내와 현관문을 열고
불빛 한 줌 없는 빈집의 불을 켜야 한다
여전히 차가운 바다 밑인 듯
구명조끼를 동여맨 아이가 갇혀 있다
– 「빈집」 부분
어디에도 따스한 4월은 없다 급기야
와르르 무너진 하늘 아래 시푸른 생매장
누대에 누대를 걸쳐온 악마들의 권력이
비로소 부족분의 순장을 완성했다
– 「순장」 부분

윤석정
시인.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자 2007년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를 결성했고 문학공연 기획·제작 및 연출을 즐겨했다.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이메일 pungkyung@empal.com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이미지제공.삶창
2020년 1월 (12호)
상세내용
트렌드리포트
장애의 시선⑤ 시집 『통증을 켜다』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시인
눈동자는 쪼그라들어 가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짓무른 손가락 끝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눈동자
그즈음 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여유를 배웠다
스치기만 하여도 환해지는
열 개의 눈동자를 떴다
– 손병걸,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부분
어린 시절,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손의 감각으로만 걸었던 적이 있다. 이날은 칠월칠석이었고 나는 해가 저물도록 귀가하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칠령사(내 고향에 있는 작은 절)에 갔다. 여느 때처럼 우리 동네 어머니들은 절에서 불공을 올렸고 타지에서 온 불자(佛子)들에게 밥을 챙겨줬다. 나는 바깥채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며 솥뚜껑을 열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빨리 가자고 떼를 썼다. 술에 취한 듯 불콰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달빛마저 구름에 덮여 눈앞이 깜깜했고 아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는 어머니 손을 꼬옥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길가의 나무들을 더듬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환해지는 감각
손병걸 시인의 시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를 읽는 순간 선명하게 떠오른 옛 기억이었다. 손이 눈이 되어준 유일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른살이 되던 1997년에 희귀난치성질환 베체트씨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때 그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줬던 게 문학이었고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시인이 됐다. 그는 “피를 토하듯 삶에 대한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우울한 노출증 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주어진 삶에 대한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긍정이 있어야 했다”(에이블뉴스, ‘시각장애 손병걸 시인에게 시는 구원’, 2017.10.26)고 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은 그의 시집 『푸른 신호등』(문학마루, 2010),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애지, 2011), 『통증을 켜다』(삶창, 2017)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 시인의 밝은 어둠과 마주하려면 먼저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를 관통해야만 한다. 그는 시적 대상이나 정황을 감각적으로 포착해 사유하고 상상력을 부풀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시에서 평상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과 대면하게 된다. 그의 세 번째 시집 『통증을 켜다』는 어둠 속에서 환해지는 감각들이 가득했다. 그가 열 개의 눈동자를 갖기 전까지 ‘직접 보지 않으면/믿지 않고 살아왔다(「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고 고백했듯 그동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시각)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지 않았나 되돌아봤다.
보이지 않는 것
손병걸 시인의 시편들은 묵직하고 진정성 있는 시 세계를 펼쳤다. 이는 ‘진실 없는 허구에 아름다움이 없듯(「소꼬리」)’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하게 시적 표현을 했기 때문이리라. 그의 사유와 상상력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정서와 생활, 사회적 문제 등에 맞닿아 있다.
눈을 뜨고는 알 수 없는 말
단연코 들을 수 없는 말
(중략)
비어 있어서 명백히
비어 있지 않다는 드넓은 소리
밤하늘에 빛나는 시공의 소리
– 「빈칸」 부분
시집 『통증을 켜다』의 서시 「빈칸」에서 시적 화자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로 낭독을 들으며 ‘활자와 활자 사이’ ‘행과 행 사이의 빈칸’ ‘빈 줄’을 소리로 듣는다. 그래서 시인은 눈을 뜨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여백의 울림(말)을 ‘꽉 찬 공명’ ‘먹먹하게 환한 저 빈칸 혹은, 빈 줄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바람을 덧칠하는 생생한 사물들
소리의 상형문자들 내 귀를 후벼대며
더 크게 더 짙게 속속들이 채색하는
까무룩 완성된 그림 한 점 향기가 명쾌하다
– 「묵화를 그리며」 부분
화자는 몸속에 고인 어둠이 넘쳐 돌벼루 속에 찰랑이고 어둠보다 선명한 것을 사유한다. 이내 화자는 어둠으로 보이지 않는 ‘텅 빈 시간과 공간이 내어준 산골짝 산수화’를 그리면서 ‘바람을 덧칠하는 사물들’ ‘소리의 상형문자들’이 채색한다는 상상을 펼친다. 이러한 시인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까.
빠끔히 열린 방문 사이로
딸아이 그림 그리는 소리 흘러나온다
하얀 도화지를 간질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소리 소리가
소나무 두루미 해바라기 바다가 되어
형형색색 살아나는 그림
(중략)
비 그친 새벽 소실점 찍힌 하늘이 환히 열리고
햇볕 머금은 푸른 강물 일렁이는 도화지에서
휘영청 떠오른 무지갯빛 향기로운 소리가 난다
– 「하얀 도화지의 소리」 부분
하얀 도화지에 딸이 그림 그리는 소리를 들으며 화자는 보이지 않는 소리만으로 형형색색 살아나는 그림을 연상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마음속에 자란 풍경을 떠올리며 손에 쥔 붓의 농도를 고민한다. 화자는 ‘짙은 지하방 어둠을 지우’고 ‘무지갯빛 향기로운 소리’를 듣는다. 단연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소리의 향기가 아닐까 싶다.
이 겨울은 이렇게 살자
그러나 여기는 이주 대책 우선 지역
뽀족한 방법이 없는 기관에서
골머리를 앓는 산동네가 아니던가
– 「산동네 골목 안 오케스트라」 부분
머리맡 창밖 경사진 골목길
발소리 발소리 위로 꽃향기 수 놓으며
송이눈꽃 송이눈꽃 하얗게 쌓이는 겨울
나는 얼른 보일러 온도를 두어 칸 내린다
이 겨울은 이렇게 살자
– 「곶감」 부분
어쩔 수 없는 봄이다
골목 안 부산한 발소리만큼
겨우내 굳게 닫혔던 창문들
빠짐없이 활짝 열리며
일제히 말문이 터지는 봄이다
– 「산 108번지」 부분
「하얀 도화지의 소리」에 지하방이 나오듯 시인은 삶의 공간을 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 시에서 가난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골목에서 오케스트라를 듣고 송이눈꽃의 향기를 맡고 일제히 말문이 터지는 봄을 느낀다. 시인의 두 눈은 닫혔지만 지난날들을 기쁘게 걸어왔고 흰지팡이로 환한 외출을 한다. 그의 긍정적인 삶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비 갠 후」)’하기 때문에 어둠보다 밝음을, 절망보다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다고 시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다룬 「몰락의 바다」, 청소년들의 투신자살을 그린 「목련꽃 뉴스」, 세월호의 슬픔을 함께한 「빈집」과 「순장」 등이 그러하다.
채 피지 못한 꽃봉오리
꽃향기 꽃향기 어지러운
달빛 꺼진 캄캄한 밤
고층아파트 꽃대 위에서
또 한 송이 목련꽃 진다
– 「목련꽃 뉴스」 부분
돌아오지 않는 아이가
바다 속에 갇혀 돌아올 수 없는 아이가
멀쩡히 숨 쉬고 있다
(중략)
죽지 못해 살아 있어 살아야 할
나도 분명 할 일 있다 아내와 현관문을 열고
불빛 한 줌 없는 빈집의 불을 켜야 한다
여전히 차가운 바다 밑인 듯
구명조끼를 동여맨 아이가 갇혀 있다
– 「빈집」 부분
어디에도 따스한 4월은 없다 급기야
와르르 무너진 하늘 아래 시푸른 생매장
누대에 누대를 걸쳐온 악마들의 권력이
비로소 부족분의 순장을 완성했다
– 「순장」 부분

윤석정
시인.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자 2007년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를 결성했고 문학공연 기획·제작 및 연출을 즐겨했다.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이메일 pungkyung@empal.com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이미지제공.삶창
2020년 1월 (12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최신 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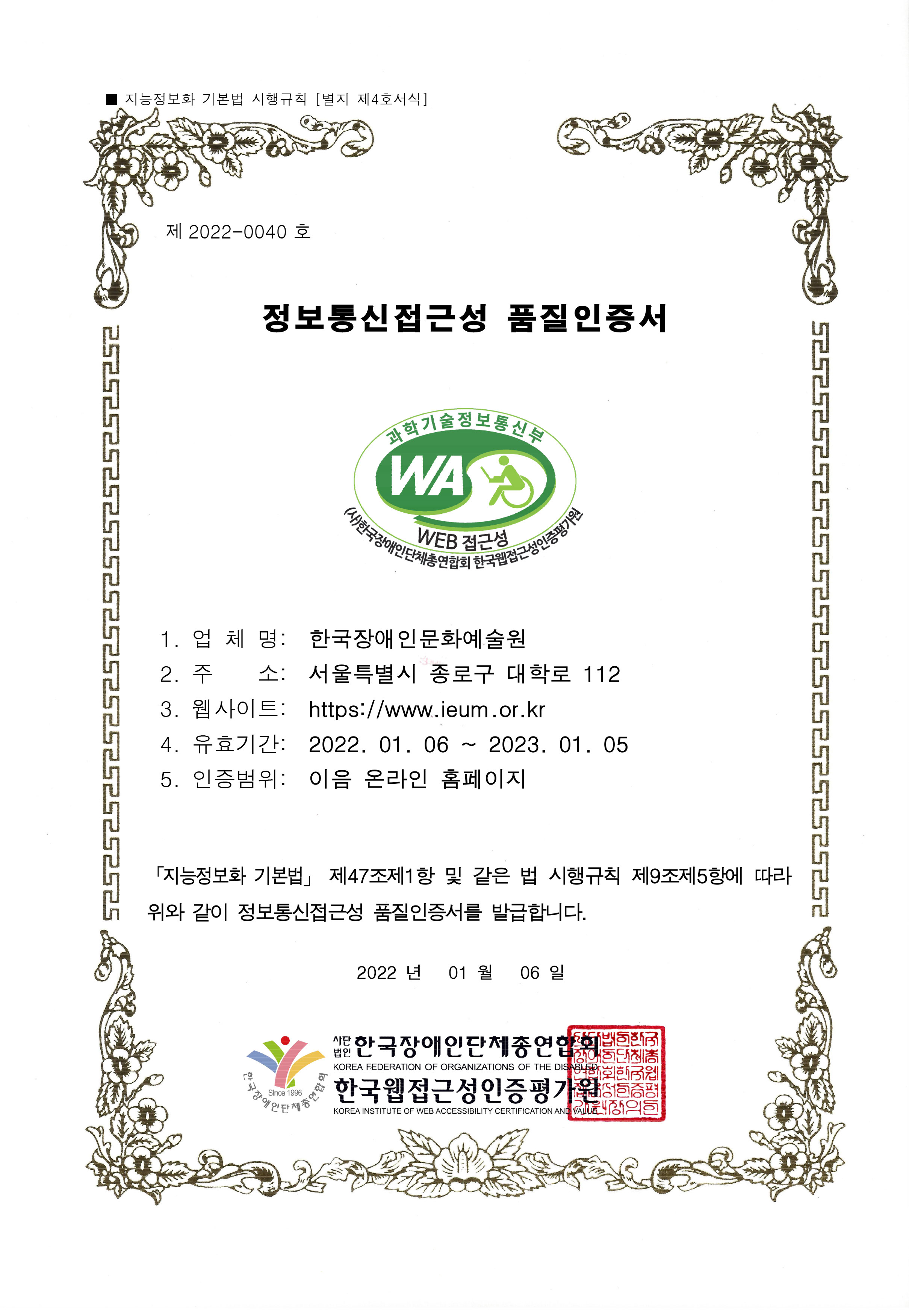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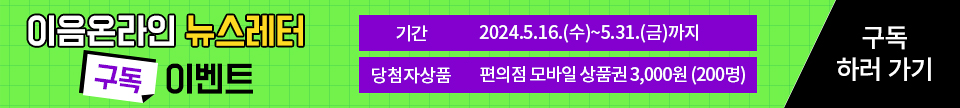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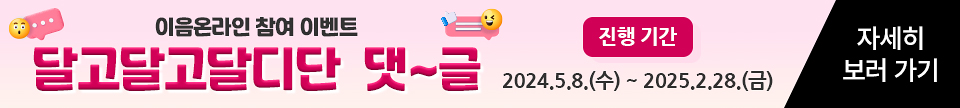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