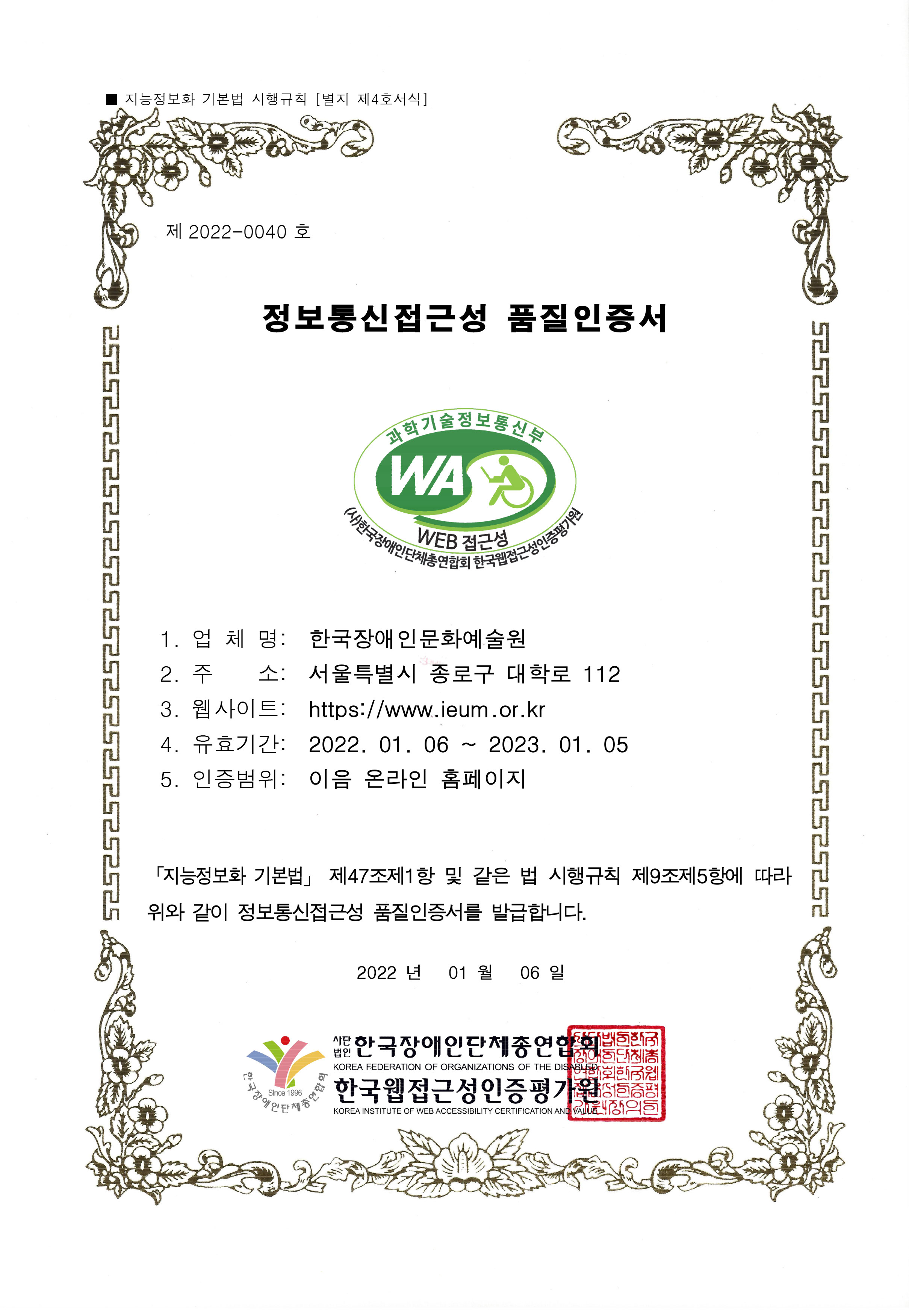우리는 흔히 연극, 영화, 전시회 등을 즐기러 갈 때 ‘관람하러 간다’라고 말한다. 관람(觀覽)이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는 모두 ‘볼 관(觀)’ 자에 ‘볼 람(覽)’ 자를 사용한다. 모두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은 어떠할까. 우리는 연주회나 콘서트를 갈 때도 흔히 ‘보러 간다’라고 말한다. “연주회 들으러 간다” “콘서트 들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연주회나 콘서트도 주목적은 음악을 듣는 것이지만, 그 공연 속에서 연주자나 가수의 퍼포먼스 및 여러 무대의 모습을 같이 즐기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을 즐김에 있어 시각이라는 감각이 가지는 영향력은 이러한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시각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내재되어 있다. 라디오는 어떠할까? 라디오는 청취하는 것이니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여, 라디오도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으로도 같이 즐기는 매체가 되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진행자가 “보이는 라디오를 확인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디오도 시각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람’이 기본인 이 세상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적응(適應)’.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게 한다’는 단어가 이 상황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쩌겠니, 네가 이겨내고 적응해야지.”
이 시대는 모든 개인에게 닥친 상황을 온전히 그 개인의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장애’라는 것도 그러하다. 장애는 개인이 가진 의료적 손상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배리어프리 영화와 공연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시각장애인 관객으로서 몇 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나는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공연을 즐기고 싶지 않다. 영화를 예로 들면, 현재 화면해설 및 자막이 있는 영화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특정 극장에서 시청각 장애인만을 위한 상영을 한다. 시간대도 거의 평일 낮이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힘들다. 최신영화를 해주기는 하지만 외화는 별로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영화 즐기기는 분리되고 제한되는 것이다. 연극도 배리어프리로 진행되는 경우 특정 날짜에만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장애인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비장애인과는 분리되는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장애인이 즐기라는 식의 이러한 서비스는 이제는 사라졌으면 한다. 장애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공연을 즐기는 그 순간만이라도 이 사회의 구분선을 느끼지 않고 작품에 빠져드는 한 명이 되고 싶다.
둘째로, 나는 배리어프리 연극에서 연출가나 작가의 의도가 담긴 화면해설을 듣고 싶다. 공연 안에서의 시각적인 장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해설도 필요하다. 무대의 구조나, 배우의 의상 등은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해설이 공연에 온전히 빠지고 싶은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등장인물 간에 대화가 진행되다가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앞의 내용 전개상으로 미루어 침묵의 여백을 온전히 느껴도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해설을 위한 해설’을 위해 “침묵.” 등의 단조로운 해설자의 음성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의 해설은 나에게는 해설이 아니라 참견쟁이가 되는 것이다. 작품의 감정선을 깨는 화면해설은 온전히 빠져들고 싶은 공연 즐기기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대한 해설도 그렇다. 예를 들어 몸을 떠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저 “몸을 떨고 있다.”라고만 하기보다는, “곧 쓰러질 듯이 떨고 있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태를 담은 해설을 듣고 싶다. 조명도 “빨갛다” “붉다”와 같은 직접적 해설보다는 “뜨거운 붉은색 조명이 비친다” 또는 “몸을 녹여주는 봄 햇살 같은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비춘다”와 같이, 조명이 극에서 주는 감정적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물론 조명이 극에서 별로 중요치 않다면 공연 전에 조명의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연극을 볼 때 연출가나 작가의 의도를 알고 싶다. 완성된 작품 위에 있는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는 해설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연극 즐기기의 훼방꾼이 된다. 만약 연출가나 작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해설하지 않았으면 한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 부분에서 해설이 없는 이유를 상상하면서 공연을 즐길 것 같다. 이런 경우 공연 후에 연출가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도나 해설을 들을 기회가 별도로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셋째로는, 시각이 중심이 되는 미술이나 무용 즐기기다.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다. 회화작품이나 조형작품은 관람 전에 작품의 질감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한다. 도화지도 만져보고 조형 작품도 만져보고 싶다. 물론 이것은 작품에 사용된 같은 도화지나 소재의 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즐기게 될 회화작품과 조형작품에 대해 조용히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저 상상하며 느끼고 싶다. 무용은 사실 움직임 모두를 세세히 해설로 듣기는 어려운 분야다. 무용과 함께 흐르는 음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용도 공연 전에 주된 움직임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직접 움직여 보고 공연 안에서는 크고 굵은 움직임과 꼭 설명해야 하는 동선만 해설로 전달받으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문화예술 즐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 바람이다. 그동안 여러 연극이나 영화, 미술전시, 무용 공연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나의 시각장애인 지인 중에는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하나가 있다. 함께 즐기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공연이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좁은 생각이다. 화면해설과 함께하는 연극, 사전에 체험하고 해설로 감상하는 미술이나 무용 즐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관람하지 않는다. 즐길 뿐이다.”
즐기는 그 순간, 나의 특성으로 인해 분리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획이 많아지면 좋겠다.
장근영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당사자로 시설접근성 및 공연 배리어프리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에 자전적 시각장애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어쩌려고 혼자 다녀?』를 출간하였고, 2022년 연극 <비추다 :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를 공동창작하고 출연하였다.
zzangkku9902@naver.com
사진출처. Pexels.co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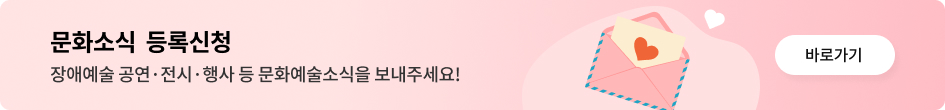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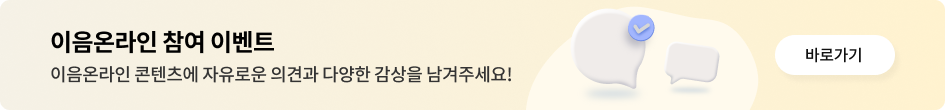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